경제이슈분석 3호-한국 주력 제조업 현황과 과제

한국 주력 제조업 현황과 과제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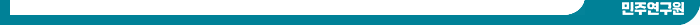
◎ 국내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볼 때 우리 주력 제조업인 전자·자동차·철강·조선 산업의 상 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은 모두 부정적임 ㆍ상기 분야 주요 기업의 상반기 매출은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하락하였으며, 영업이익도 대체로 감소하거나, 적자를 기록함 ㆍ단기적으로 세계경제 침체와 엔화-유로화의 약세, 구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. ◎ 제조업 생산의 부진에 대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ㆍ단기적으로 일부 철강제품의 미국 내 반덤핑 제소,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. ㆍ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혁신을 통한 제조업 재도약 방안이 필요 ◎ 특히 각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에 대응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점검 및 국내 공급사슬 고도화를 위한 ‘제조업 혁신 3.0’의 개선 및 적극적인 추진 필요 ㆍ미국의 (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) ‘신행정 행동계획’, 독일 ‘인더스트리 4.0’, 일본 ‘일본 재흥전략 개정판 2015’, 중국 ‘중국제조 2025’ 등 세계 각국은 적극적 노력에 나서고 있음. ◎ 정부, 특히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요망됨. ㆍ각 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. ㆍ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세계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신속한 점검과 근본적인 방안 구축만이 국내 제조업의 해당 기업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. |
국내 주력산업의 주요 기업 상반기 실적
❍ 최근 발표된 국내 주요 대기업의 2/4분기 실적을 볼 때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전자, 자동차, 철강, 조선 산업의 상반기 성과는 부정적임
❍ 2015년 주력산업별 주요 대기업 상반기 매출 성과,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하락하였음.
- 표1>의 8대 기업 중에서 상반기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(96.99조원)이며, 현대 자동차(43.76조 원)가 그 뒤를 잇고, 가장 작은 기업은 삼성중공업(4.05조원)임
-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하락률(-38.1%)을 기록하였으며, 삼성전자(-9.78%)와 현대제철(-11.7%), 현대중 공업이 10% 내외의 큰 하락률을 보임.
❍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하락하였으며, 상승한 기업도 흑자 규모가 작거나 적자 를 기록함
- 삼성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0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며, 삼성전자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 2 조원 이상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음.
- 흑자를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 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현대제철이 유일하나 그 규모는 2천억원에 불과함.
❍ 각 산업의 부진은 공히 수요 둔화와 주력 분야의 낮은 성과에 기인함.
- 전자산업의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는 주로 정보통신기기의 낮은 성과 때문에, 자동차산업은 국내 내수 와 북미 수출 증가에도 유럽 및 신흥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를 주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음
- 철강산업의 부진은 세계 교역 및 중국 수요 둔화 등을, 조선산업은 특히 해양플랜트 수주의 부실화를 상반기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
한국 주력산업의 대내.외 환경과 하반기 전망
❍ 주요 대기업의 실적은 한국 주력산업의 현황에 그대로 반영되어, 상반기 수출 및 내수 실적뿐만 아니 라 하반기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❍ 무역협회에 따르면,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5.1% 감소한 2,687억 달러, 수입은 15.6% 감소한 2,224 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
- 품목별로 보면 선박(12.2%), 반도체(6.0%)는 호조세이나 여타 품목은 부진한데, 선박의 경우 수출은 증 가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함
❍ 산업연구원은 상반기 제조업 생산은 수출 및 내수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나, 하반기 생산은 소재산업 군(철강, 석유화학 등)의 수출 악화 등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는 멈출 것으로 전망 함
- 하반기 자동차, 조선, 반도체의 수출 전망은 밝지만, 철강, 석유화학, 정보통신 및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 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거나 어두운 편임
- 더구나 한국을 포함한 대미 철강수출국에 대한 미 철강업체의 반덤핑 제소로 인해 향후 철강의 대미수 출은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
❍ 전문기관들은 상반기 국내 제조업 생산의 침체 요인으로 단기 요인과 구조 요인을 지적
- 단기·경기적 요인으로 세계시장 수요 둔화[1], 엔화·유로화 약세 등을 거론
- 구조적 요인으로 중국 성장전략 변화(가공무역 억제, 산업 자급률 제고)에 대한 대응 미흡, 기술경쟁력 확보 정체,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확대 추세 등을 언급하고 있음[2]
[1] 세계경제 성장률(%, IMF): (’07) 5.7 → (’13) 3.4 → (’14) 3.4
[2] 한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증가율(%)은 급격히 감소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(2004년 47.7% → 2014년 -0.5%), 기 술 수준 역시 최근 5년간 미국을 100으로 볼 때 84 내외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2013년 6.2%에서 2013년 18.3%로 10년간 약 3배로 늘어났다
현재 한국 제조업의 어려움은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해소가 어려우며, 국가 차원의 면밀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한데, 현재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음.
❍ 단기적 요인으로 제시된 세계경제 침체, 엔화․유로화 약세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 수준에서 불가항력적 인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 요인은 처음 맞는 상황도 아니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나, 철강과 조선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돌파구 모색이 어려운 상황임.
- 철강의 경우 미국 철강업체의 반덤핑 제소로 인하여 미국 수출 감소가 우려됨.
- 조선은 해양플랜트 수주 부실화,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 및 산업은행의 부실관리감독 의혹이라는 내 부적 요인을 기업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움.
- 일부 철강제품의 미국 반덤핑제소 해결과 추후 발생가능성 차단, 조선업계의 잠재 부실화 대응, 구조조 정에 의해 발생가능한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
❍ 구조적 요인은 개별적 기업 차원을 벗어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데, 이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 처하고 있다는 신호가 없음.
특히 각국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제조업 혁신에 나서고 있어 한국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수림하 고 대응해야 함.
❍ 미국은 2014년 10월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‘신행정 행동계획’을 수립했고, 독일은 2015년 4월 ‘인더 스트리 4.0’ 전략을 정부 주도로 변경했으며, 일본은 2015년 6월 기존 ‘일본재흥전략’을 미래 투자 및 생산성 혁명에 맞춘 ‘개정판 2015’로 개정함
- 특히 중국은 주요 제조업 선진국의 혁신정책과 관련하여 올해 5월 '2025년 세계 제조업 2강 대열 진 입'을 목표로 '중국제조 2025'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짐
❍ 이들의 의도는 부품 및 소재뿐만 아니라, 설비 및 장치 역시 자국 생산을 확대시켜 글로벌 가치사슬에 서 자국 부가가치 생산 비중을 높이려는 것임.
- 예컨대, iPod가 미국에서 299달러에 팔릴 때, 이를 조립하여 수출한 대만의 부가가치 수출은 5달러인 반면, iPod를 직접 수출하지 않은 일본은 한 대 팔릴 때마다 27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함[3]
- 총부가가치 수출을 총수출로 나눈 비율인 VAX ratio가 2011년 0.59로 미국(0.79), 일본(0.81), 독일(0.69) 뿐만 아니라 중국(0.75)보다 낮은 현실에서[4] 국내 전문가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 인 검토와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.[5]
❍ 이러한 논의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추진과 함께 공급사슬을 통한 가치 총량 확대 추진이 필요함을 시 사함.
- 수입의존형 고부가가치 제품만큼 중부가가치 제품도 국내 공급사슬 고도화를 통해 국내 총생산에 기여 할 수 있으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은 양 방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사슬의 고도화는 곧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할 것임
❍ 궁극적으로 국내·외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의 첨단 소비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업이 최고 수준의 첨단 장비·소재·부품·디자인 등을 담당한다면, 한국 경제의 지위와 역할은 크게 높아지고 확대 될 것임.
- 최근 미국과 독일, 일본, 중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과 여러 연구기관의 권고안을 보면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
[3] Linden, Greg, Kenneth L. Kraemer, and Jason Dedrick, “Who Captures Value in a Global Innovation Network?: The Case
of Apple’s iPod,” Communications of ACM, Vol. 52, No. 3, 2009, pp.140~144. 참고로 한국은 1달러.
[4] 정성훈(2014,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, 한국개발연구원) VAX ratio는 수출에서 자국이 생산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원자재, 생산 설비 및 장치, 소재 및 부품, 에너지 등을 수입에 의존할수록 작아 지고, 그 반대의 경우 커진다. 이론적으로 VAX ratio의 최소값은 0보다 크며, 최대값은 1이 된다.
[5] 포스코경영연구원 (2015.07.08, 한국 제조업 ‘Buy National’ 검토가 필요한 시점), 현대경제연구원 (2015.07.10. 가공·중계무 역의 규모 추정 및 시사점) 같은 민간연구기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(2015.07.16.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)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..
각국의 노력과 비교할 때, 한국 정부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추진 의지도 부족
❍ 현 정부의 제조업 관련 산업정책은 ‘제조업 혁신 3.0’에 집약되어 있는데, 각 국 제조업 정책과 공급사 슬 혁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뿐 아니라 적극적인 추진의지도 부족해 보임.
- 201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‘제조업 혁신 3.0’은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공급 사슬 제고에 기 여하겠지만, 이에 대한 명시적인 추진전략은 제시하지 않음
- 대부분의 과제가 최근 들어서야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를 발표하거나 여전히 미발표된 상황임.
- 미국, 독일, 일본, 중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을 고려하여 ‘제조업 혁신 3.0’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.
❍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'해외진출 촉진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'라는 정책 기조 하에 FTA와 정상 외교,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제시하고 있는데,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고, ‘제조업 혁신 3.0’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에 그침
- 정부의 이런 대응은 세계경제 침체와 엔화-유로화 약세라는 단기적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족하며, 정상외교는 해외진출 촉진에 있어서 하나의 계기일수는 있지만 이를 전체과정의 대응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
- ‘제조업 혁신 3.0’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중기(中企)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, 100대 글로벌 생 활명품 육성 이상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어 공급사슬 혁신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움
정부와 청와대의 정책 대응 방향과 방식의 전환이 절실함.
❍ 공급사슬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민간에서는 선진국들의 리쇼어링(reshoring, 해외생산에서 자국으로 제조거점 회귀)을 평가하며 자국의 근면하고 숙련된 현장인력, 탄탄한 부품· 소재산업과 제조생태계, 이상 세 가지 필요조건을 제시[6] 하고 있는데, 이는 제조업 부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
- 현재 추진하려는 노동시장개혁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면을 저해하거나, 숙련형성을 방해하고 이미 형 성된 숙련을 파괴하면, 이는 한국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임
- ‘제조업 혁신 3.0’과 함께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계획에 부품·소재산업 지원, 탄탄한 제조업 생태 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유관 부처의 역할과 함께 포함되어야 함
❍ 지난 해 세월호 사건, 올해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볼 때 정부 관련 부처의 기동력과 적시 대응력이 미 흡한데,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방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임.
- 정부 정책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여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시해야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,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전문가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사실.
- 관련 부처장관들조차 제도적 권한에 따른 자기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 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거나, 대통령의 지시는 언제나 적시에 이루어지는데 명확하지 않은 이유 로 정책의 적시 시행이 어려웠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함
- 담당 부처의 정책 세부 내용까지 대통령의 언급이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실시되지 않는다면, 정부의 기 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음.
❍ 부처의 책임 정책 추진, 자율성의 필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의 만 기친람식 정부 운영과 이에 기대는 정책 추진은 무능할 수밖에 없음.
- 한국 제조업에서 정부의 역할이 실종된 것인지, 불가항력적인지, 무능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.
-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책임과 자율의 기조 아래에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되살려야 할 것임.
[6] LG경제연구원, Weekly 포커스, 2015.1.14
♣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,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